멈춘 시詩、時
2021. 12. 5. 20:20ㆍ짧은 글
<江 배 >
저녁 볕을 배불리 받고
거슬러 오는 적은 배는
왼江의 맑은 바람을
한돛에 가득히 실었다.
구슬픈 노젓는 소리는
봄하늘에 사라지는데
江가의 술집에서
어떤 사람이 손짓을 한다.
- 한용운, 조선일보 1936. 4. 3,
<江 배 > 全文
———
<合掌>
들이라. 단 두 몸이라. 밤빗츤 배여와라.
아, 이거봐, 우거진 나무 아래로 달 드러라.
우리는 말하며 거럿서라, 바람은 부는 대로.
燈불빗헤 거리는 해적여라, 稀微한 하느便에
고히 밝은 그림자 아득이고
퍽도 갓가힌, 풀밧테서 이슬이 번쩍여라.
밤은 막깁퍼, 四方은 고요한데,
이마즉, 말도 안하고, 더 안가고,
길까에 우둑허니. 눈 감고 마주섯서.
먼먼山. 山 뎔의 뎔鍾소래. 달빗츤 지새여라.
- 1925- 김소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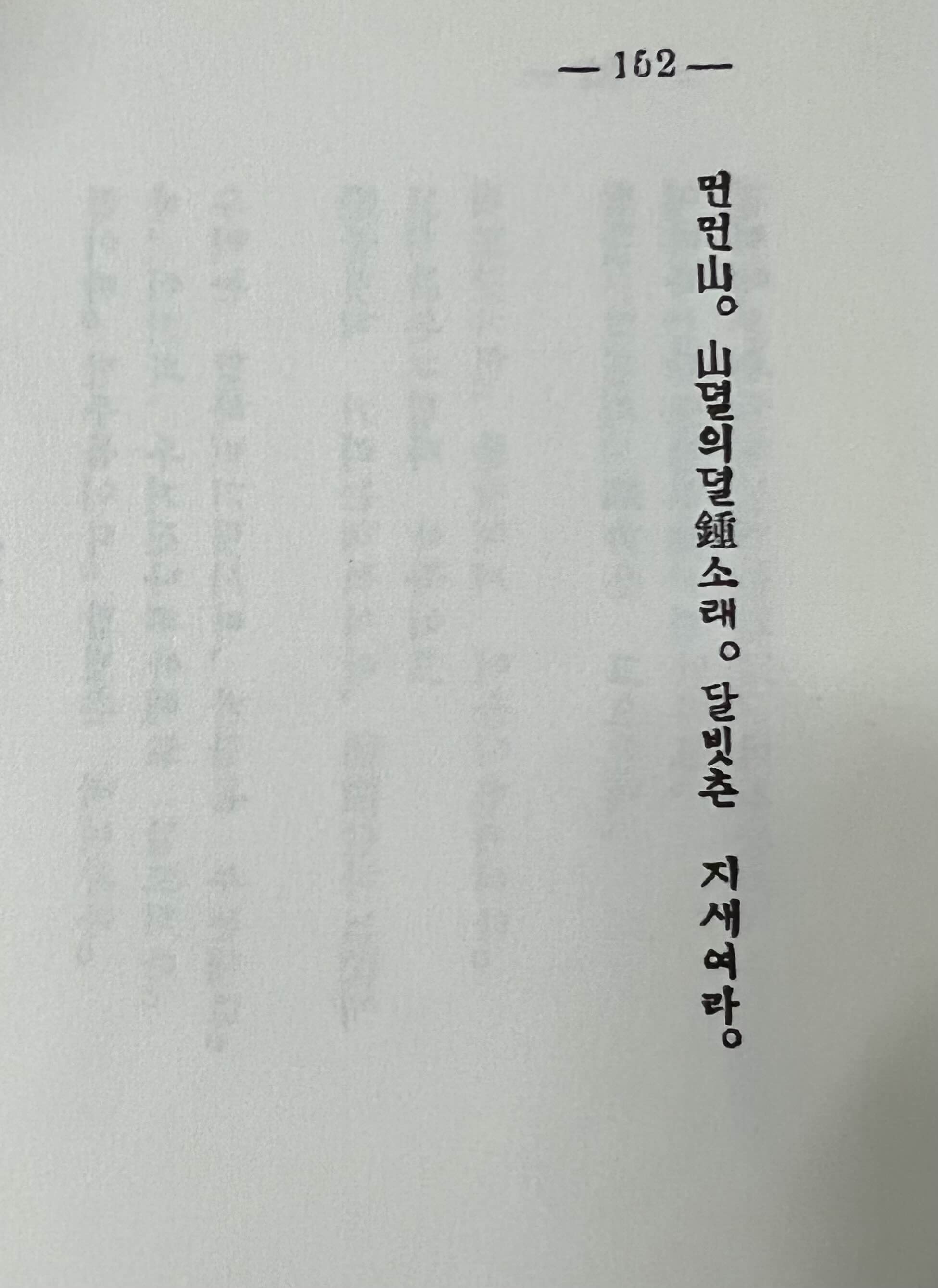
———
<합장>
들에서 단 두 사람이라. 밤 빛은 배여오고.
“아, 이거봐!”
우거진 나무 사이로 달이 들어오고.
우리는 말하며 걸었어라. 바람이 부는 대로.
등 불빛에 거리는 헤적이고. 희미한 하늘 편에
멀리엔 고히 밝은 달 그림자 아득하다.
퍽도 가까이엔 풀밭에서 이슬이 달빛을 머금어 번쩍여라.
밤은 막 깊어서 사방은 고요한데
얼마전부터 말도 안하고, 더 안 걷고,
길가에 우두커니. 눈 감고 마주섰어라.
먼 먼산. 산 절의 절 종소리…
달빛은 지새어라.
—————
'짧은 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잔치 (0) | 2022.01.11 |
|---|---|
| [머리 깎다가] (2) | 2022.01.08 |
| 《一心清淨、法界清淨》한 마음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. (0) | 2021.12.05 |
| [죽을 때 열 번 염불] (0) | 2021.12.03 |
| [만선동귀집 원문] (0) | 2021.11.30 |